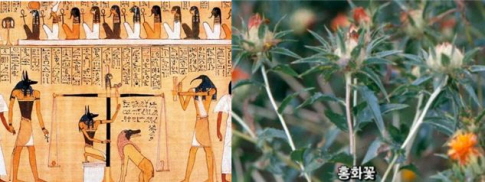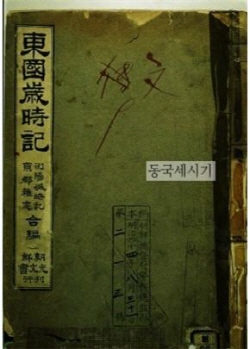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식생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짐에 따라 현대의 사람들에게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옷차림이나 패션 등에서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고 미용 분야에서도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네일아트는 최근 들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뿐 아니라 남성층에서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 개인이 네일아트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네일샵이 늘어나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네일아트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고자 행하던 일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나 중국에서는 신분의 구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귀신을 쫓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던 만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다.
매니큐어란 라틴어의 손을 의미하는 'manus(마누스)'와 손질을 의미하는 'cure(큐어)'가 합쳐진 용어로 손톱손질과 손마사지, 손화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네일 에나멜(enamel)이 매니큐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매니큐어는 처음 시작된 뒤 5000년에 거쳐 변화해 왔다. 최초의 매니큐어는 B.C 3000년 이집트와 중국의 귀족층에서 누렸던 것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Manicure set가 발견됐다. 미이라의 손톱에 빨간색을 입히거나 태양신에 바치는 제사에도 사용됐다.
또 손톱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져 관목에서 나오는 헤나의 붉은 오렌지색으로 손톱을 염색했는데, 왕과 왕비와 같이 신분이 높은 층은 진한 적색을 물들이고 신분이 낮을수록 옅은 색상을 물들여 손톱 색상을 통해 신분과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상류층 여자와 남자들의 경우 부의 상징으로 손톱을 길렀으며 손톱손상을 막기 위해 보석이나 대나무를 이용해 손톱을 보호했다. 또 입술연지를 만드는 ‘홍화’의 재배가 유행해 입술연지와 함께 손톱에 바르기도 했으며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염료를 사용해 입술과 손톱에 칠하기도 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네일아트는 폭넓은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이 개발됐고 네일 테크닉과 제품의 전문화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네일 끝을 뾰족하게 한 아몬드형의 네일 형태가 유행했으며 빨간 기름을 바른 후 부드러운 염소 가죽을 이용해 손톱에 광택을 내기도 했다.
1830년 발 전문의사인 사이트(site)가 치과에서 사용되던 기구와 도구에서 착안한 오렌지 우드스틱이 네일 관리에 사용됐으며 사이트의 조카에 의해 네일케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됐다.
1900년대에는 유럽에서 스퀘어 형태의 네일이 유행하면서 메탈파일이나 메탈가위를 이용해 네일관리를 행하기 시작했다.
옅은 색의 크림이나 가루로 네일에 광을 주거나 낙타털을 이용한 붓으로 네일에 임시적으로 광을 내는 시기에서 전기기구를 이용해 손톱광택을 내는 기구들과 네일 에나멜 리무버, 큐티클 오일 등이 개발됐다.
1932년에는 다양한 색상의 네일에나멜이 제조됐으며 레브론사에서 최초로 립스틱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에나멜을 출시하면서 인조손톱이 등장했다.
헬렌커리(Helen Gerly)가 처음으로 네일 케어를 미용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네일팁(nail tip)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당시 호일을 사용해 시술한 패티네일(pattinnail)이라고 불렀던 아크릴네일 (acrylic nail)을 최초로 행해졌으며 1957년 이후부터 패디큐어가 등장했다
손톱에 모양을 낼 수 있는 액세서리, 에시(essie), 오피아이(OPI)등의 브랜드가 유행했고 미국의 매니큐어리스트인 타미테일러가 파우더, 프라이머, 리퀴드 등의 아크릭네일제품을 개발하면서 네일 산업이 급성장하게 됐다. 또 인기스타들에 대중화되면서 더욱 본격화되면서 발전됐다.
손톱을 예쁘게 보이려는 욕구는 동서양의 구분 없이 이뤄져 왔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손톱에 물을 들이는 풍습은 서양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볼 수 있는 매니큐어는 20세기 초에 보급됐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손톱에 봉선화꽃물을 들이곤 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 중 하나이며 아직까지도 매니큐어 대신 봉선화물을 들이는 여성들이 있다.
고려시대에 봉선화는 ‘염지갑화’, ‘지갑화’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손톱에 물을 들인다는 의미로 부녀자와 처녀들 사이에서 봉선화 물들이기는 하나의 미용풍습이었다.
봉선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송나라 때 고려로 건너왔거나 원나라 공주가 고려로 시집오면서 몽고의 풍속이 전해진 것으로 조선시대 세시풍속집인 ‘동국세시기’에는 “젊은 각시와 어린이들이 봉선화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라고 나와 있다.
조선시대에는 귀천에 관계없이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이는 미용풍속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손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미인의 조건으로 손은 ‘섬섬옥수’여야 하고 다산, 다남의 조건으로 ‘손은 마치 봄에 솟아난 죽순 같으며, 손바닥의 혈색이 붉어야 한다’고 해 어느 시대보다 손에 대한 속설도 많이 생겨났다.
중매쟁이들도 처녀의 손을 만지며 온기와 함께 수상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손톱이 붉지 않은 처녀들은 봉선화 꽃과 잎사귀를 잘 간직했다가 일년 내내 물들이기를 했다.
필자 약력 :
성결대학교 출강, 로레알 파리 본사(국제상품기획부)
레브론, LG생활건강 근무
연락처 : 019-359-7718
E-mail : cjsoleil@naver.com